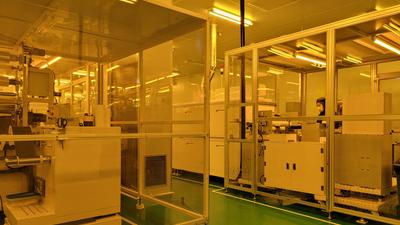매년 이맘때면 전기자동차업계에 한바탕 큰 소란이 벌어진다. 예측 불가이던 새해 정책이 12월에 나오기 때문이다. 소란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전기차 보급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개인 구매자에게 지원해 온 충전기 보조금을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정용 완속충전기 보조금·설치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를 선정, 아파트 등 공용주차장 시설물 위주로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인에게만 주던 혜택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유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관련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얼핏 보면 개인 보조금 축소로 인한 불만으로 보이지만 정작 시장이 우려하는 건 가정용 충전 인프라까지도 민간 사업자가 도맡게 되면서 벌어질 충전 비용 부담이다. 환경부는 통신·전력을 포함해 충전 인프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에 가정용 충전인프라사업 관리권을 넘길 계획이다. 사업자가 끼면 유지·보수 등 비용이 발생, 적어도 ㎾h당 56원인 충전(전기)요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기차 이용자 입소문에 가장 큰 자랑거리인 연료비(전기요금) 절감 요인이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대로 신규 충전 인프라 사업을 노리는 민간업자에겐 새 사업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 반길 일이다.
다만 매년 연말에 새 정책이 남발된다는 점은 바로잡아야 한다. 최소 1년 정도는 시장에 알려서 불확실성도 줄이고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한다. 그런데도 소란은 매번 연말에 되풀이된다. 지난해 말에는 정부가 구축한 공용충전소 유료화, 그 전에는 2015년부터 없앤다던 충전기 지원책을 재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업계가 시장 대응 전략을 짤 시간이 없다. 새해를 불과 20일 정도 남겨 둔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해야 할 업계로선 답답하고 짜증나는 심정이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을 키우려면 기업과 충분히 소통하고, 로드맵에 따라 정책을 짜임새 있게 계획해서 펼쳐야 한다. 이제는 시장으로 옮겨간 전기차 산업이 클 수 있는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