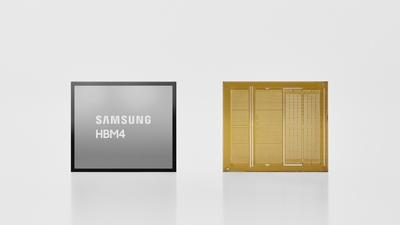1980년대 후반이다. `1943`이란 오락실 인기 게임이 있었다. 전투기로 항공모함을 격침하는 슈팅 게임이다. 배경은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인 미드웨이 해전이다. 전작 `1942`보다 화려한 그래픽과 무기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 게임을 즐기는 후배가 갑자기 이렇게 묻는다. “형, 이 게임 신기하지 않아요? 항공모함이 일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 미군이 공격을 한다. 게임 제작사 `캡콤`은 일본회사다. 일본 항공모함을 때려 부수는 게임을 일본 업체가 만들었다.
두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과연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날이 올까. 만일 우리나라에 `1943` 같은 게임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20년이 지나 그날은 왔다. 콘솔 게임은 아니나 온라인 게임으로 우리도 게임 강국이 됐다. 뒤 의문은 아직 안 풀렸다. 당분간 풀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곤욕을 치를지 뻔하니 만들 게임업체가 없다.
캡콤은 왜 이런 게임을 만들었을까. 일본이 전쟁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강조한 건가. 게임 소비 대국 미국을 겨냥한 상업주의인가. 뒤는 확실히 성공했다.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1943` 게임이 문득 떠오른 건 최근 잇따른 게임 규제 때문이다. 청소년의 심야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여성가족부), 학부모가 원하면 접속을 끊는 `선택적 셧다운제`(문화체육관광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쿨링오프제`(교육과학기술부) 등이다. 우리 게임산업 환경은 반세기 전의 일본보다 못하다.
게임 중독에 대한 사회의 우려를 이해한다. 게임으로 밤을 지새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부모, 자녀가 게임 시간을 놓고 다투는 게 많은 가정의 풍경이다. 쉽지 않겠지만 서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게임을 알면 자녀와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다. 자녀가 책을 더 읽거나 가정 일을 도우면 게임시간을 더 늘려주는 협상도 필요하다.
물론 가정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청소년은 있다. 이때 학교, 정부, 지역 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독 예방 교육도 좋고, 스포츠와 같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대안도 좋다. 부모 대상 교육도 절실하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중독 치료센터가 나설 때다.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규제만 찾는다. 거의 중독이다. 여성부, 교과부로 번지니 전염병 같기도 하다. 그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정책 실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게임만큼 좋은 게 없다는 인식이다. 자녀의 게임 몰두에 질린 학부모들 덕분에 바이러스 배양은 더 잘된다. 규제도 창의적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규제를 내놨다. 게임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는 획기적인 이론도 제시했다. 그 논리적 비약이 상상을 초월하고 오묘하다.
`마녀사냥`을 당한 게임업계만 죽어난다. 규제 3종 세트에 잔뜩 위축됐다. 매출이 줄어들까봐. 아니다. 당장 위축돼도 큰 타격은 아니다. 통제력을 잃은 청소년이 부모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업계에 정말 큰 타격은 좌절감이다. 게임인을 마약상인처럼 취급하는 나라에 살면서 자괴감만 쌓인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지난해 게임 산업을 옛 만화산업에 빗댔다.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오해를 받아 죽어버린 그 산업 말이다. 만화인처럼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다. 정부의 규제 중독도 문제지만 제대로 싸우지 못한 게임인의 잘못도 없지 않다.
업계가 이런 게임을 내놓으면 어떨까. 타이틀은 `2012`다. 게임 개발사, 게임 이용자를 사냥감으로 삼은 슈팅 게임이다. 게임을 사악하다고 믿는 관료와 학부모는 게임산업에 대한 적개심과 스트레스를 풀 때까지 신나게 폭격한다. 끝내면 `1943`의 조종사가 애인에게 그랬듯이 한마디 되뇌며 일상으로 돌아간다. “전쟁은 끝났어. 아, 그래. 정말로 잘됐어.”
신화수 논설실장 h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