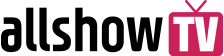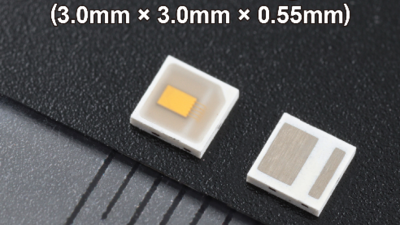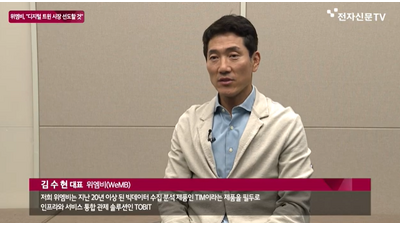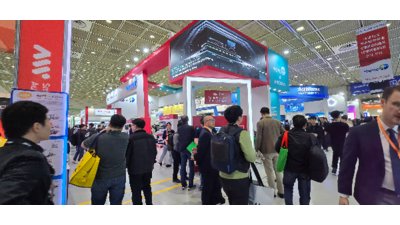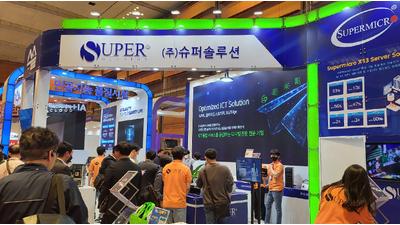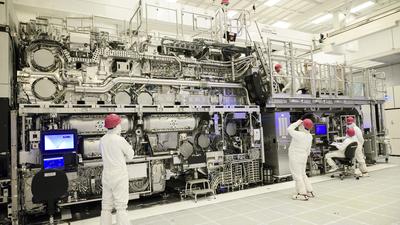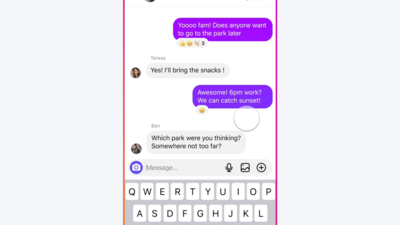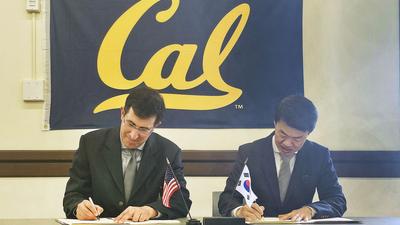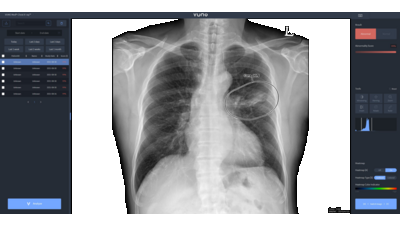환경부 분위기는 요즘 한 마디로 말해서 '좋다'. 20년 숙원사업인 조직 확대 개편에 성공하면서 실과 국을 신설, 승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적체됐던 인사 물꼬가 트였다. 환경개선 의지가 어느 정부 때보다도 높은 만큼 위상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힘 없는 부처' 간판을 떼고, '강한 부처'라며 어깨를 으쓱해 보일만도 하다.

환경부는 1994년 부로 승격한 후 예산이 지난해 9배로 증가했음에도 실·국은 늘어나지 않았다. 그 사이 환경의 중요성이 커져 업무가 확대됐지만 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지 못했었다. 최근 국장 승진 심사를 마친 한 과장은 '2004년 과장이 된 이래 15년 만에 국장으로 승진했다'며 감회를 표했다. 조직이 커진 덕분이라는 얘기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물관리일원화가 실현되면 환경부에는 한 개 실이 더 늘어난다. 24년 간 2개 실 체계였다가 단 숨에 두 배인 4개 실로 확대된다. 본부에 실이 4개 이상 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이른바 거대 부처다. 환경부가 그 대열에 합류하는 셈이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홀대 받았던 환경부를 생각하면 고무적인 성과를 기뻐하고 누려도 된다고 본다. 하지만 커진 덩치와 권한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연일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미세먼지, 산업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고질적인 지역가뭄 해소와 4대강 수질 개선 등 환경부가 풀어야할 현안이 산적했다.
환경부의 권한이 커진 것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국민의 소망 때문이다. 커진 조직만큼이나 늘어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환경부가 돼야 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