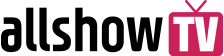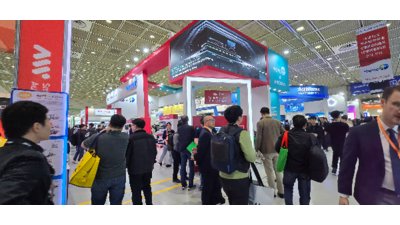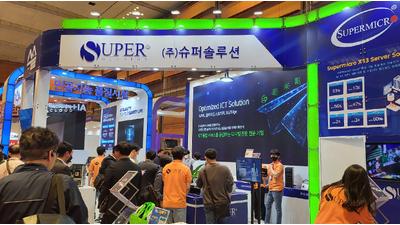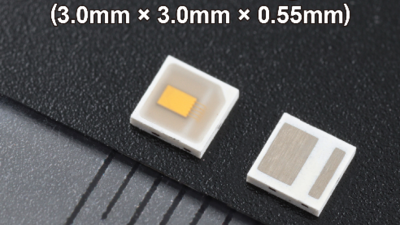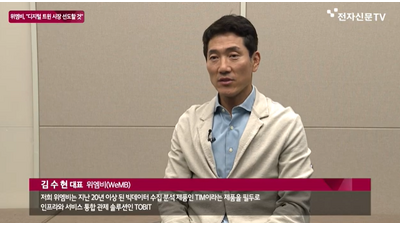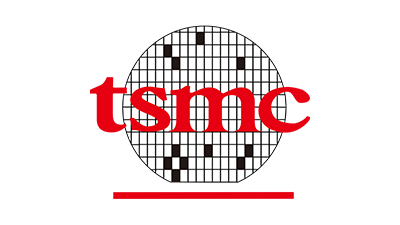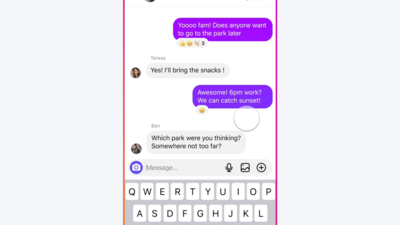우리나라에 감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신라시대다. 중앙 관부의 하나인 사정부가 있어 백관의 기강을 바로잡고 통제했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이 그 역할을 했다.
지금과 같은 틀을 갖춘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헌법으로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을 검사하는 심계원을 설치하고, 정부 조직으로 감찰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1963년 감사원법을 제정해 감사원으로 통합하고 지금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발전했다.
주요 업무는 국가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감독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것이다. 공직 기강을 세우고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감사를 받는다.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 감사원 감사도 받는다. 그런데 감사를 대하는 과학기술계의 입장이 심각하다. 과기인들 입에서 “감사가 연구원들의 연구 의욕을 꺾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크게 늘었다. 창의 연구를 위해서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의 동의가 있음에도 요즘 감사에는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 목적과 효율은 따지지 않고 당초 계획에서 조금도 벗어나도 '전용'으로 몰아 징계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심지어 한 출연연 원장은 “수탁한 연구 과제 제목에 담긴 죽은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바꾸고자 해도 허락을 안 한다”면서 “감사에 지적 당하지 않으려면 아무 생각 없이 문서에 적힌 문구대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꼬집는다.
일하는 연구원에게만 감사가 몰리는 것도 문제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일을 안 하면 아예 감사받을 일도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 우수 혁신 사례로 꼽힌 한 출연연의 오픈랩 건축 사업을 감사원이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징계는 피했지만 담당자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의욕도 내려놓았다.
올해 출연연 대상 감사의 강도가 한층 높아진 듯하다. 출연연별로 2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 지난 10년치 업무를 샅샅이 뒤지는 수준이라고 한다. “10년 전에 한 업무와 연구 활동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하느라 다른 업무는 거의 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10년 전 업무를 지금 기준으로 소급해 감사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하는 연구원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출연연 통합감사 카드를 들고 나왔다. 출연연 자체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우려가 있으니 감사 기능을 NST가 거둬들여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출연연은 지나친 외부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난리인데 출연연의 연구 의욕을 북돋아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NST가 또 다른 외부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원광연 NST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부 감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이슈”라고 했다.
여야는 NST 스스로의 역량이 의심스러운 데다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출연연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