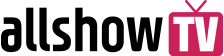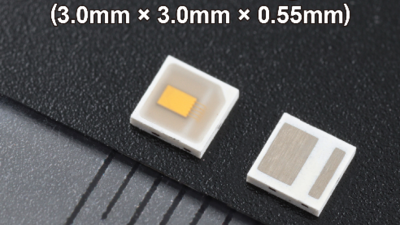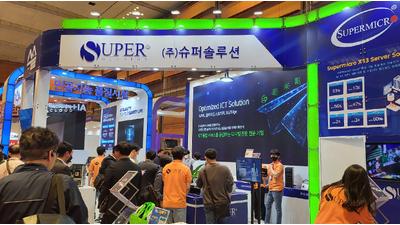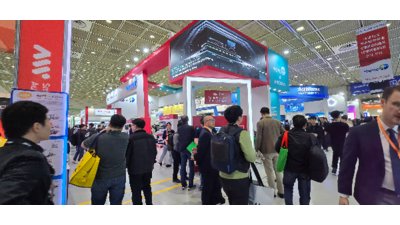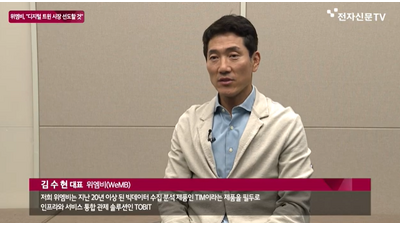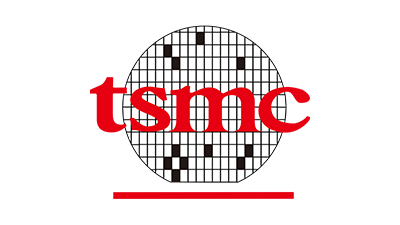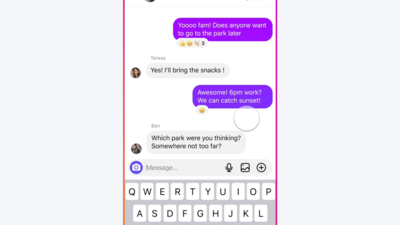“많은 사람이 개인간거래(P2P) 금융에 왜 기관이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이름 때문에 개인만 참여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Peer to peer lending'은 2015년 국내에 '개인끼리 대출'이란 의미로 정착했다. P2P 다운로드를 연상케 했기 때문이다. P2P 다운로드는 개인용컴퓨터(PC) 여러 대에서 업로드한 파일 조각을 플랫폼에서 합친 후 완성된 파일 형태로 내려 받는다.
해외에서 먼저 유사한 방식의 금융이 등장했다. 개인들로부터 모은 돈을 플랫폼에서 다른 수요자에게 대출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P2P 대출'이라 명명했다. P2P 금융 전체가 '대출'로 대표되면서 '투자' 영역은 가려졌다. 금융 당국에서는 P2P 금융을 대부업법으로 규제했다. P2P 업체에서 사기·횡령이 발생하거나 P2P 업체가 부도를 맞아도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었다. 투자자 보호 기준이 없는 대부업법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P2P 업체는 자체 대출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한 뒤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해서 대출을 실시한다. P2P 금융을 규정하는 제도가 없어 벌어진, 사실상의 우회로다.
'P2P'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개인간 거래라는 언어적 한계 때문이다.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인데 왜 기관 자금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실제 대출자는 일반 개인이 아니다. 연 2000만~3000만원 매출을 내지만 단기 유동성 문제가 생긴 자영업자,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형 빌라 건축업자 등으로 다양하다.
이런 현실에도 금융 당국은 여전히 'P2P 대출'이라는 용어를 고수하고 있다. 언어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처럼 국민들의 사고력을 제한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정통'이라는 단어를 '바른생각'으로 바꾸고, 사용 가능한 단어 수를 최대한 줄여서 비정통적 사고 표현을 원천 차단했다.
P2P법제화 논의에 맞춰 벌써 '온라인 대출 중개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업계도 '마켓플레이스금융'이라는 명칭을 들고 나왔다. P2P 금융 법제화와 함께 산업을 규명할 용어도 재정립해야 한다. 명칭과 현실에 간극이 생기면 법제화 이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언어는 사고력을 지배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