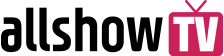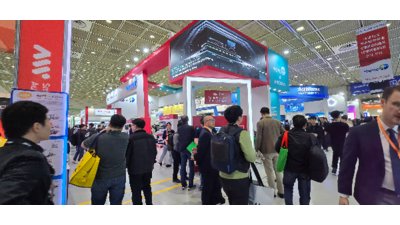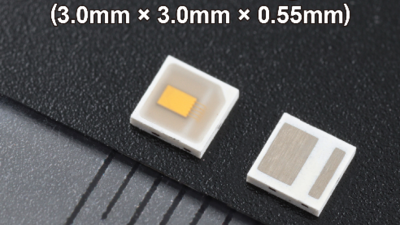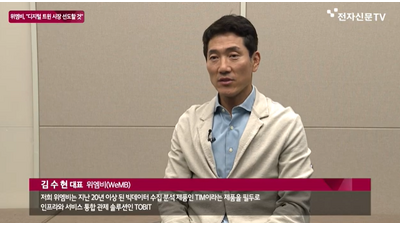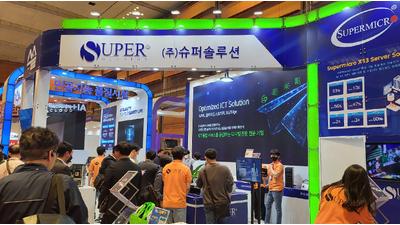게임산업은 1992년 대한민국 최초 상업용 PC게임이 출시된 이래 26년간 노조가 없었다. 갑작스러운 노조 설립 열풍이 부는 이유는 뭘까. 게임계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 분석할 수 있다. 산업·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전에 없던 요구가 생긴 점,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국내 게임 산업은 1996년 '바람의 나라'와 1998년 '리니지'를 토대로 성장했다. 2000년 전후 유입된 인력이 2010년 중반에 들어서자 '40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게임 개발에 필수적인 창의성과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유연함이 40대에도 있을지 고민이었다. 관리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자영업밖에 방법이 없다고 여겨졌다. 대다수가 40대를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퇴물이라고 여겼던 시니어 인력이 회사를 나가 모바일 스타트업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자연스레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중소기업에 40대 개발자가 경력을 이어갔다. '정년'이라는 단어가 게임 산업에도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시장 상황도 변했다. 과거에는 성공 시 받는 높은 인센티브를 보고 고용 불안을 참았다. 게임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몇몇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큰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성공해도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갔다. 특히 품질보증(QA), 고객지원(CS) 직군 등 지원 조직은 보상을 기대하기도 힘든 비정규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기반 고용 환경을 타파하고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고용 요구가 생겼다.
외부 환경변화도 한 몫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게임 노동자들도 환경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임사가 모여있는 판교, 구로, 가산 등지에 밤늦게까지 불 꺼지지 않는 사무실을 '등대'라고 부르는 말은 낯설지 않다. 크런치 모드가 당연하고 회사에서 숙식하는 걸 훈장으로 여기는 업계였다. 불가능할 것 같은 단축일정을 해내면 전설처럼 회자됐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