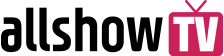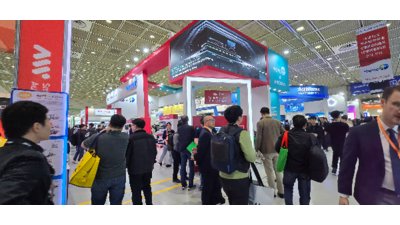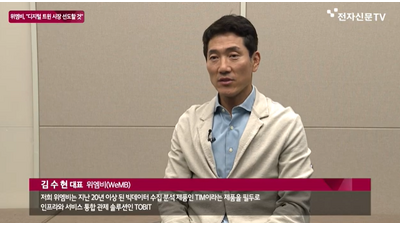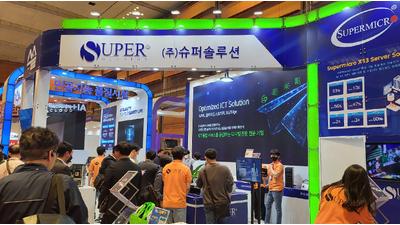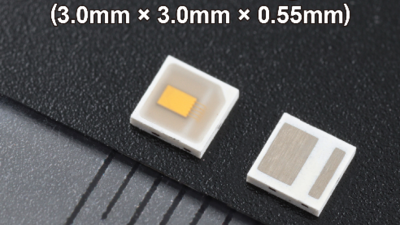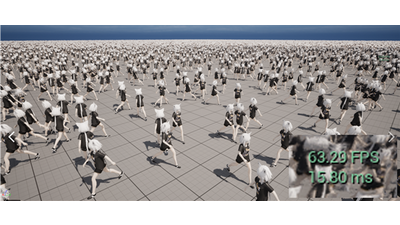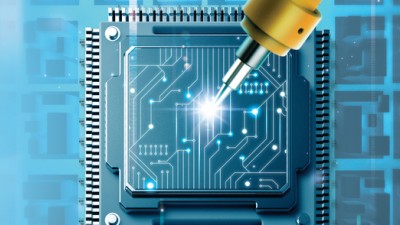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 필수설비 공동구축·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내에 필수설비 의무제공제도가 신설된지 17년 만이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통신 경쟁정책과 기술 진화에 따라 의무제공 대상과 범위가 지속 확대돼 왔다.
국내 시장에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출발점은 2001년 KT 민영화다.
민간기업이 된 KT가 수십년간 국민이 전화요금으로 낸 돈으로 구축한 설비를 독점하게 되면서 공적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설비 측면에서 KT 지배력이 우려됐다.
옛 정통부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2001년 필수설비 제도를 도입했고 2003년 KT를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했다.
KT가 보유한 전주, 관로, 동케이블 등이 필수설비 의무제공 대상이 됐다. 당시 유선전화 이용 대가는 표준원가 계산 방식을 기반으로 산정토록 했다.
2009년 KT가 KTF에 대한 인수합병을 신청하자 필수설비 문제가 논쟁 핵으로 떠올랐다.
경쟁사는 통신사업자 최대 매출 규모로 탄생하는 유·무선 통합 KT 시장독점 강화를 해소하기 위한 인수합병 조건으로 필수설비 사업부문 구조분리를 내걸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 중재 아래 △의무제공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구축 △필수설비 정보제공 요청 및 통보 방법 다양화 △감독기구 운영 △인입관로 임대 확대 등 11개 사안에 통신사가 합의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됐다.
2012년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한국케이블방송협회는 KT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필수설비 전담회사 구조분리와 관련 고시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설비 제공 기준 개선과 제공 절차 구체화, 관로 용어 명확화 등이 진행됐다.
이후에도 무선 관련 설비는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고 광케이블도 2006년 이후 구축한 설비는 활용할 수 없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5G 조기 상용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조기상용화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필수설비 공동활용·공동구축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망 구축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은 물론, 10년간 4000억~1조원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