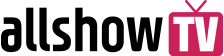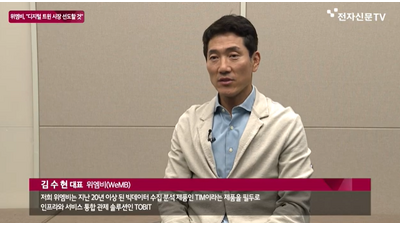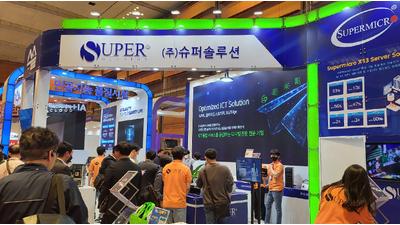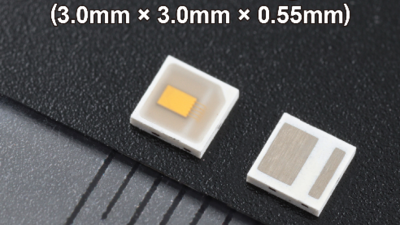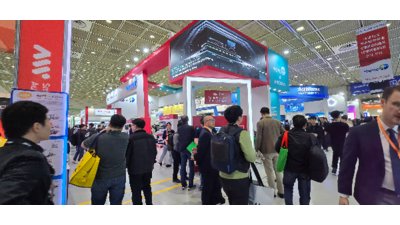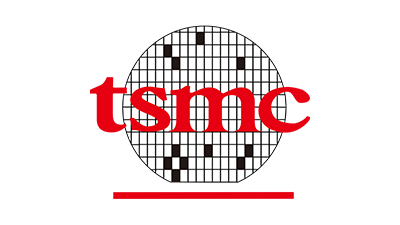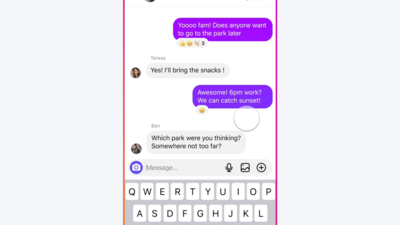'출퇴근 시간 외 카풀, 택시 합승, 운전사를 고용한 렌터카, 개인 간 차량 유료 공유….'
이들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모두 불법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O2O(Online to Offline)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가 등장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체계는 50년 넘도록 같은 틀에 갇혀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도 기술과 서비스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체계 정비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기존 사업자 반발이 이유다.
◇규제체계, 50년 넘게 그대로
최근 앱을 활용한 택시 합승 부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앱을 이용하면 정확한 거리 계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목적지가 비슷한 다른 이용자를 찾기도 쉽다. 합승 부활의 여건이 조성됐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저렴해진다. 택시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환영받을 서비스다. 일본 도쿄는 합승 택시를 시범도입하면서 교통비 절감과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에 들어갔다. 하지만 택시 합승은 우리나라의 기존 법 체계 아래에서는 도입이 요원하다.
지난 해 이찬열 의원 등은 영리 목적의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유료 카풀을 제한하는 법안 2개가 더 발의됐다. 앱을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200만명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들어서는 주춤하다. 불법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이 꺼린 탓이다.
제도의 벽은 두꺼웠다. 운전자가 기존 서비스 운영시간 외에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4시간씩 설정해 이용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내놓자 서울시가 경찰에 고발했다.
차량공유(카 셰어링) 서비스가 급성장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개인 간 카 셰어링은 국내에서 불법이다. 현재 운영되는 서비스는 차량을 공유하기 보다는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앱을 통해 무인으로 운영한다는 점과 1시간당이 아니라 10분 단위 요금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개인의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을 때 유료로 공유(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극심한 주차문제에도 주차장 공유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개인 주차 공간을 공유하려면 주차장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절차가 복잡해 개인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아파트 같은 공유지 역시 쉽지 않다. 도로의 거주지우선주차구역 같은 공간은 아예 공유가 불가능하다. 심각한 주차난 속에 바로 옆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넘쳐나지만 소용없다.
주차장 공유 사업을 고안한 스타트업 대표는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보니 국내에서는 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불편을 해소할 아이디어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규제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급속히 발전하는 자율주행 기술도 국내에서는 서비스 모델로 이어지기 어렵다. 수요응답형(온디맨드) 자율주행 버스 개발이 활발하지만 법체계는 그대로다. 혼잡한 시간과 한산한 시간을 구분하고, 한산할 때 수요에 응답해 다니는 자율주행셔틀이 이르면 2020년 시범도입된다.
지금처럼 노선버스와 수요응답형서비스를 구분하고, 수요응답형 역시 농어촌 등으로 나누는 체계 아래에서는 유연한 서비스 도입이 힘들다. 올 해 말부터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추가되지만, 이 역시 까다롭다. 융합형 서비스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손놓은 정부
유료 교통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961년 12월 제정돼 이듬해 시행됐다. 수많이 개정됐으나, 택시·버스·대여사업 등을 획일적으로 구분한 것은 변함이 없다.
획일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문제는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여행사가 15인 이하 렌터카에 운전기사까지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불법이다. 차량을 대여할 때 16인승 이상은 전세버스로, 15인승 이하는 렌터카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객운수법 3장 34조는 외국인·장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여행객이 아니라 여행사가 렌터카 업체와 계약하면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여행사 직원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면서 가이드하는 상품이 일반화됐다.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별도의 계약을 맺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관행이지만 불법이다.
편법·변칙만 양산한다. 유명 쇼핑몰이 추석·설 등 명절 때 택시를 동원해 선물을 배달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명절이 가까이 오면 배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 택배서비스는 물량 초과로 접수조차 어렵다. 택시가 화물 운송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택배 자체를 이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다보니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ICT 기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도 논란이 반복된다. 표를 걱정해야 하는 정치권으로서는 기존 사업자의 이권을 무시할 수 없어 시대와 동떨어진 법안을 내놓기 부지기수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기존 법 체계를 다듬어야 하지만 이권 문제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여객운수사업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도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전체 교통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 완전히 틀을 바꾸는 작업이 요구된다”면서도 “규제 타파나 법제도 개선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