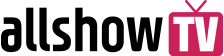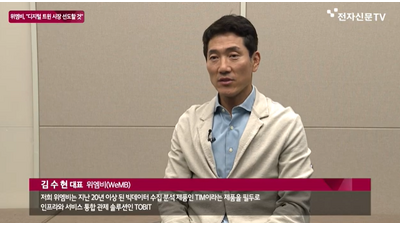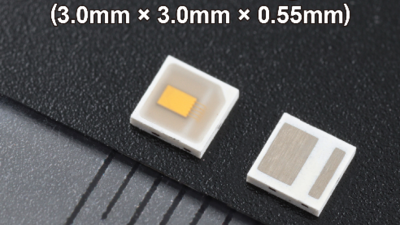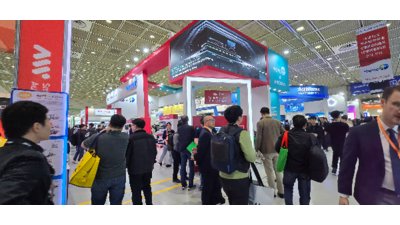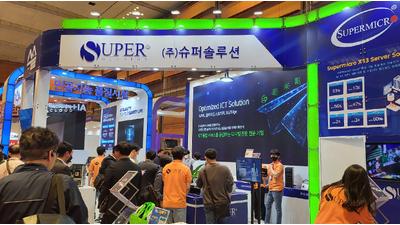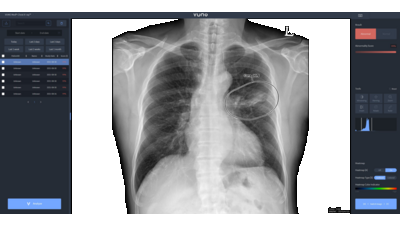로봇이 긴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빙판을 주시한다. 카메라로 위치를 확인하는 모양새가 국가대표 컬링팀 '안경선배'처럼 매섭다. 카메라를 접고 빙판을 자율 주행하며 스톤을 던진다. 스톤이 정확하게 목표점에 놓이자 경기장에 환호성이 터진다.
인공지능(AI) 컬링로봇과 인간이 최초로 컬링 대결을 벌였다. 주인공은 고려대 컨소시움이 개발한 컬링로봇 '컬리'다. 8일 경기도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컬링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 컬링로봇 경기 시연회'에서 춘천기계공고팀과 경기를 벌였다. 고등부팀이지만 지난해 이마트배 컬링대회에서 우승한 실력팀이다. 컬리는 스위핑(비질) 없이 던지기만 했고, 인간 팀은 스위핑까지 했다. 사전 경기에서 컬리가 1대0으로 이겼지만 본 경기에서는 3대0으로 졌다.
컬리는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가 결합된 로봇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고려대 컨소시엄이 개발했다. 스킵로봇이 카메라로 인식한 경기 영상을 전송하면 투구 전략을 만드는 AI 컬링 SW '컬브레인'이 최적의 투구 전략을 세운다. 경기장 반대편의 투구로봇은 힘, 방향, 스톤 컬 회전을 제어해 스톤을 목표 지점으로 보낸다.
컬리는 2년 전 국내를 AI 열풍으로 몰고 간 구글 바둑 AI '알파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만하다. 컬링은 빙판 위의 체스다. 단순히 던지는 기계 동작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AI가 바둑처럼 전략을 짜야 한다. 계산법 '몬테카를로트리서치'와 AI 방법론 '딥러닝'을 활용한다는 점도 알파고와 유사하다. 알파고가 기보를 학습했듯 국제컬링연맹 1321경기, 16만 투구샷 데이터베이스(DB)를 학습했다.
로봇공학도 필수다. 알파고가 생각만 하고 인간이 대신 놔줘야 했다면 컬리는 AI가 생각하고 로봇이 컬을 던지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정밀한 빙질 인식과 힘 조절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바둑보다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거둔 성과다. 컬링은 바둑과 달리 돌끼리 부딪히면서 위치가 바뀐다. 온도, 습도, 빙질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 매 경기 이를 재빨리 스스로 보정해야 정밀하게 운용할 수 있다.
아직 알파고처럼 '달인'을 이길 정도는 아니다. 본 경기에서 일부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대표 팀은 드로잉과 테이크아웃 정확도가 80% 수준을 넘어야 한다. 컬리는 아직까지 드로잉 정확도 65%, 상대 스톤을 밀어내는 테이크아웃 정확도는 80% 수준이다. 연구진은 올해 가을께 드로잉 뒤 빙질을 보정하는 '스위핑로봇'까지 개발되면 정확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컬리에 이용된 기술은 컬링 발전뿐만 아니라 자율 주행 등 다양한 AI 분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컬리에 적용된 기술을 AI와 기계 협업, 이동 환경에서 컴퓨터 비전 인식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대한다.
이성환 고려대 뇌공학과 교수 겸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은 “선수 경기력 향상이나 통계 분석 등 한국이 다음 올림픽에서 우승하도록 막강한 스포츠 과학기술 환경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라면서 “앞으로 컬리에 적용된 기술이 무인차 등 AI 핵심 영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