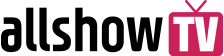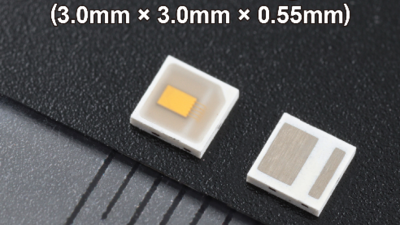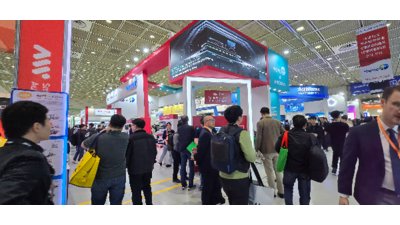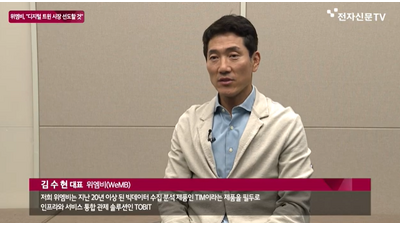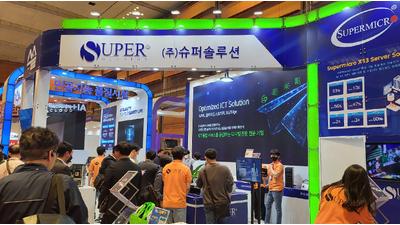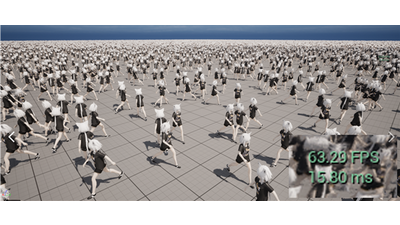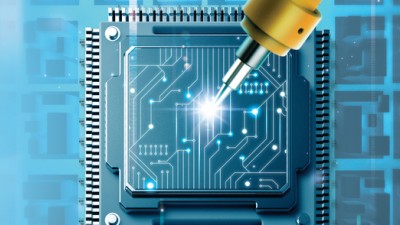우리나라처럼 단말기 보조금을 법률로 규제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해외에서는 이동통신사 시장 자율에 맡기거나 공정 거래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제한 규제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해외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덜하다. 보조금은 시장 자율로 결정한다는 인식이 정착돼 있고, 소비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편이다.
미국 시장은 사업자 자율 메커니즘이 가장 잘 작동하는 편이다. 미국은 2015년 버라이즌 등 사업자가 자진 폐지했다. 롱텀에벌루션(LTE) 스마트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많은 지원금을 투입해 가입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어진 데 따른 선택이었다.
그 대신 미국 시장은 프로모션 위주로 할인 혜택이 진화했다. 이후에는 T모바일이 버라이즌 가입자를 대상으로 단말기 원플러스원(1+1) 행사를 하는 등 보조금 대신 다양한 마케팅 수단이 활성화된 편이다.

유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유럽은 알뜰폰(MVNO) 사업자 등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통사 투자 여력이 저해되면서 사업자가 자진해서 보조금을 투입하지 않는 추세다.
보조금 규제를 보유한 국가로는 핀란드가 있다. 핀란드는 1997년 시행한 '통신시장법'에 근거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서비스 사업자 간 상품 결합을 원천 금지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보조금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했다.
일본은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 요금제를 분리하는 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이통사가 모든 단말기 서비스를 통제하는 수직적 시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단말기 보조금을 이용자 차별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인식, 이통사를 사전에 규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해외 시장에는 과도한 보조금이 사업자 간 경쟁 관계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일으킬 때 사후 규제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