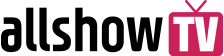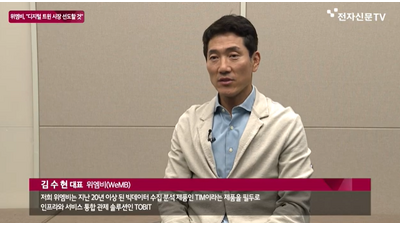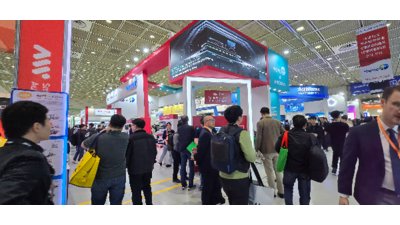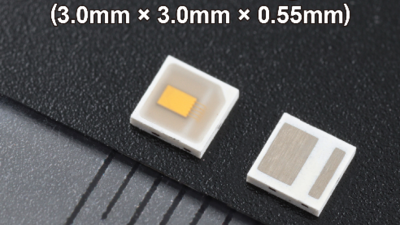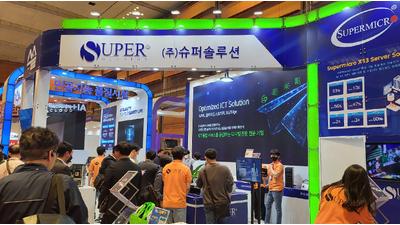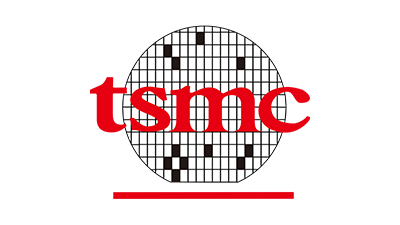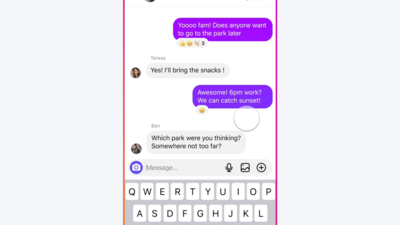팹리스 반도체 업계의 실적이 좀처럼 바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에 상장된 팹리스 업체 16곳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한 곳밖에 없었다. 아홉 곳이 적자였으며, 나머지도 성장세가 마이너스였다.
이를 기사화하자 “그렇잖아도 힘든데 그걸 콕 집어서 써야 했느냐”는 원망이 쏟아졌다. 이유 있는 항변이었다. 주요 팹리스가 한 해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비용은 매출액에서 20% 안팎을 차지한다. 어떤 업체는 이 비중이 30%를 넘는다. 금액은 낮더라도 비중은 퀄컴 같은 글로벌 업체와 동등하거나 많다. 지금 특수를 누리고 있는 국내 톱 장비 업계는 이 수치가 3%도 안 된다.
전체 R&D 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제품 개발이다.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매출을 내는 회사라 하더라도 한 번 엇나가면 회사가 휘청거린다. 창업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 팹리스 업체 대표는 “외줄 타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사 출고 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원망에 대해 뭐라 대꾸할 말도 없다. 이런 상황은 매분기, 매년 이어지고 있다.
경쟁 구도는 더 치열해졌다. 중국에는 근래 몇 년 사이 팹리스가 수백개 생겨나서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저희끼리' 잘 먹고 잘사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도 최근에는 팔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선정하면 곧바로 개발에 착수한다. 어떤 품목은 국내 팹리스와 경쟁을 벌인다. 이 탓에 중소기업 영역에 침범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그들도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누가 무슨 권리로 시장 참여를 막을 수 있겠는가.
회사를 팔고 팹리스 업계를 떠난 1세대 반도체 창업주는 말이 없다. 그들이 넘긴 어떤 회사는 중국 투기자본으로 넘어가 본업을 버리고 바이오로, 블랙박스로, 유통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지켜본 정부 관계자도 더 이상 직접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역정을 낸다.
일부 팹리스는 건재할지 몰라도 이대로는 '팹리스 업계'라고 부르기 힘든 시기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반도체 강국의 어두운 현실이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