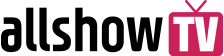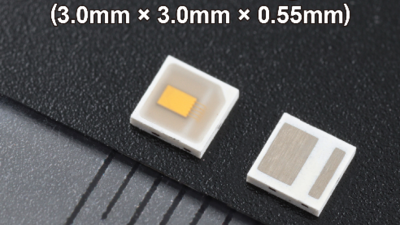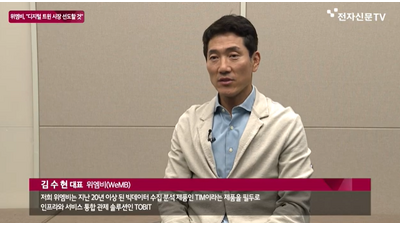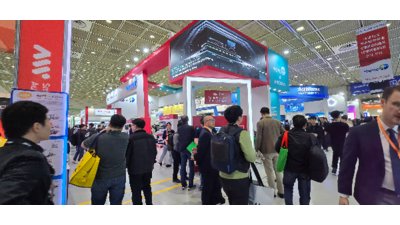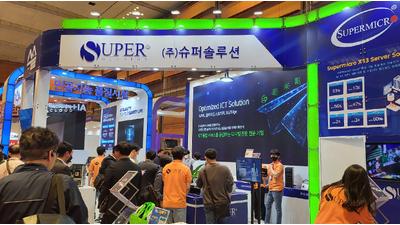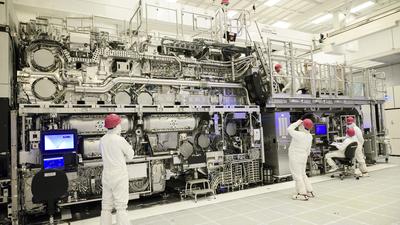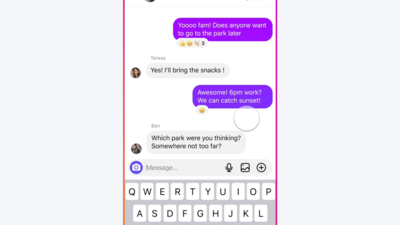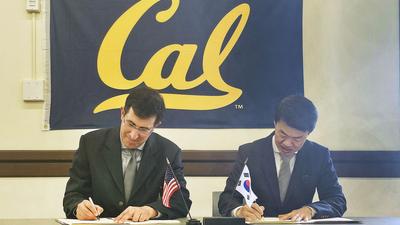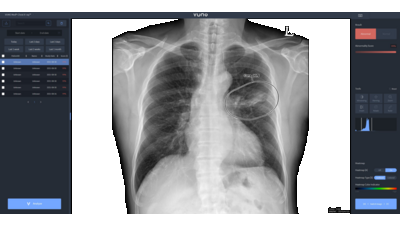선거 때만 되면 통신요금 인하가 유행가처럼 요란하다. 중소기업·골목시장·비정규직 문제처럼 원칙과 방향은 무시된 채 낮추면 된다는 식이다. 그래야 표가 모이고 유권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이슈다.
여야는 물론 정견이나 집권 철학 등은 아무 상관이 없다. 무조건 깎고 보자는 '아니면 말고 식' 흥정법이다.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무차별하게 요금 인하를 강제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자율을 막는 '직권 남용'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되풀이가 우리나라 통신산업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소모성 논쟁이란 점이다. 건전한 통신 소비 문화 형성과 기술 혁신, 투자 확대, 서비스 복지 실현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아예 틀어막았다.
물론 일정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과 수익 시현 뒤 요금 인하는 필연이다. 그리고 시장 구조상 그런 여지를 숨길 사업자도 없고, 숨길 방법도 없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막무가내 식으로 아예 감액 비율까지 정해 통신요금 인하를 천명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통신사업자의 매출과 이익 증가치를 든다.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는 5세대(G) 이동통신서비스 등 향후 투자나 신규 사업 확장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육성 계획이니 뭐니 하며 우리나라 통신 강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목청을 높인다.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통신요금의 비정상적 궤적을 호도해 보여 준다. 글로벌 통신 사업자가 보기엔 한국 정부의 이런 엇박자가 '코미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통신을 비롯한 ICT 산업의 재도약 설계가 중요하다. 국가 성장 엔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금이 갖고 있는 비중과 ICT 경쟁력의 상관 관계부터 고민을 다시 시작하라. 주요 외국 물가와 통신요금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잣대는 치우자. 우리 현실에 맞는 요금구조와 ICT 육성 청사진이 맞닿는 지점을 빨리 찾고 그것을 정책화해야 한다. 사실 대통령이 통신요금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