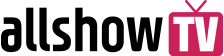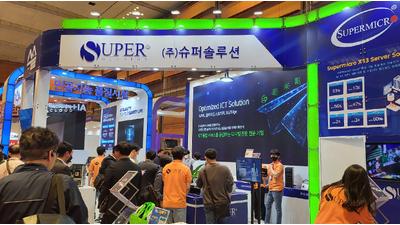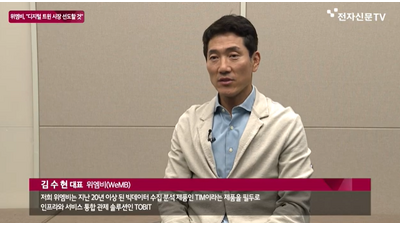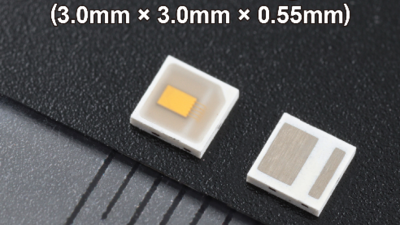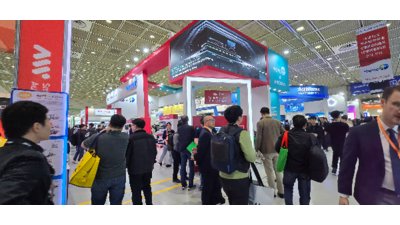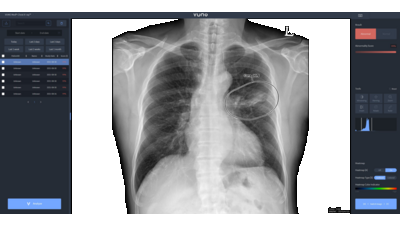현대·기아자동차가 신뢰 경영에 나섰다. 자동차 품질 논란이 빚어지면 초기에 바로 교체해 주는 것이 골자다. 수익성이 일부 악화되더라도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인다.
현대차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최근 파워트레인 계열에 불량이 생긴 자동차를 유례없이 신차로 교환해 줬다. 그랜저 시트 불량 문제에 대해서는 출고 6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하는 전 차종의 시트를 교체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조치는 이전의 현대차 대응과는 완전히 다르다. 신차에 대한 불량을 인정해도 부품 교환이 아닌 차량 자체를 바꿔 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
현대차의 전향 자세는 환영할 만하다. 당장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산차는 `뽑기를 잘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자칫 불량 차량을 구매하면 교환이 사실상 힘들어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현대차가 신뢰 경영에 나서면서 이런 걱정은 조금씩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도 멀리 보면 나쁠 것이 없다. 당장 비용이 늘어도 고객 충성도는 높아진다. 높은 고객 충성도는 재구매율 제고로 이어진다. 지속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파동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생긴 제품을 무조건 보상해 주면서 소비자는 삼성전자 휴대폰을 믿고 살 수 있다고 인식한다.
아쉬운 점은 현대차가 신뢰 경영을 들고 나온 타이밍이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점유율은 한때 80%를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경쟁차 브랜드 인기로 60% 수성도 어려운 처지다.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소비자 신뢰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한마디로 잘나갈 때는 무심하다가 힘들어지자 구애하는 모양새다. 이왕 할 것을 미리 했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컸을 것이다.
신뢰 경영도 일종의 리스크 관리다. 소비자는 문제가 터졌을 때 기존의 기업 태도와 명성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사전에 신뢰를 두텁게 쌓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위기에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신뢰 경영이 사후약방문식으로 되면 안 된다.